- 경제제재가 핵확산 저지 수단으로 쓰이지만 효과 논란
- 국가 관계 따라 차별적 적용, 비확산 체제 정당성 흔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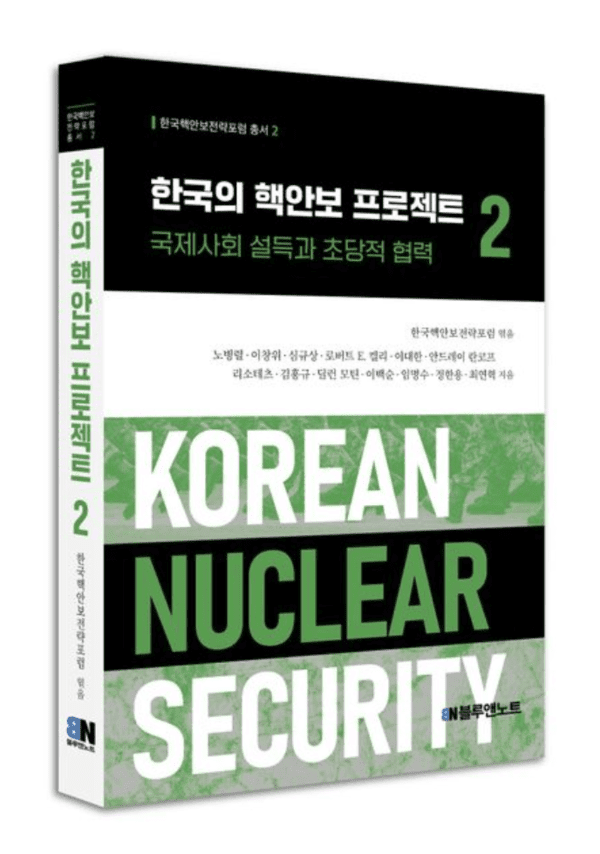
CHAPTER 12. 한국 핵무장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까?
③ 핵확산과 국제제재 적용의 한계| 노병렬 대진재 교수
경제제재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반핵확산 수단이다.
국제사회는 핵확산을 막기 위해 군사적 방법보다 경제제재를 주로 사용해왔다. 미국과 UN은 인권 침해나 국제법 위반,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핵개발 국가에 제재를 부과했고, 현재도 이란과 북한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제재가 효과적이려면 국제법적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 그리고 강도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군사적 제재는 단기간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 논란이 크다.
이스라엘의 오시락 원자로 폭격(1981)이나 미국 주도의 이라크 공격(2003)은 핵확산 방지 명분이 있었지만 UN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군사 제재는 즉각적 효과가 있지만, 단독 행동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보 불확실성에 따른 오판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군사적 방법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선호해왔다.
경제제재의 효과는 상반된 평가를 낳고 있다.
일부는 경제제재가 국제법 위반국에 실질적 압박을 가한다고 보지만, 다른 쪽은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북한 제재가 협상 참여를 유도했다는 주장과, 오히려 핵개발을 가속화시켰다는 반론이 동시에 존재한다. 1974년 이후 20건의 경제제재 중 성공으로 평가된 것은 6건뿐이었고, 나머지는 실패로 분류됐다.
경제제재 성공은 양국 관계에 달려 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제재국과 대상국의 관계가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이면 제재 효과가 높았다. 한국과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핵개발을 포기했고, 러시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도 협력 속에 비확산으로 선회했다. 반면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제재와 무관하게 핵개발을 지속했다.
제재 강도와 지속성의 이중적 접근도 문제다.
미국은 이스라엘, 일본, 프랑스 등 우방의 위반에는 형식적 조치에 그쳤지만, 북한과 이란 등 적대국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했다. 국가 관계에 따른 차별적 적용은 경제제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미국 중심의 핵비확산 체제 정당성까지 흔들고 있다.
경제제재는 완전한 해법이 아니다.
장기간의 제재도 효과가 제한적이며, 특히 폐쇄적 체제인 북한에는 정책 변화 유도력이 낮다. 결국 경제제재는 일정한 억제 효과는 인정되지만, 핵확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더구나 차별적·이중적 접근은 국제 비확산 레짐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연태웅 기자 abrahan.yeon@sand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