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 ‘거래적 현실주의’의 민낯과 ‘부국강병’의 고독한 길

2025년 11월, 대한민국 안보사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미 정상의 ‘공동 팩트시트’와 14일 공개된 ‘제57차 SCM 공동성명’은 표면적으로는 굳건한 동맹을 과시했지만, 그 이면에는 냉혹한 ‘거래적 현실주의(Transactional Realism)’가 작동하고 있었다.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SCM(11월 4일 개최) 공동성명의 발표 시점마저 통제하며 동시에 공개된 것은, 이제 한미동맹이 정례적·제도적 협의체(SCM)가 아닌 정상 간의 ‘빅딜(Big Deal)’에 의해 좌우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적 현실주의’란, 동맹을 공동의 가치와 역사가 아니라 관세율·투자액·국방비 비율이라는 숫자로 계산하는 방식의 현실주의를 뜻한다.
필자가 군사학자, 정치학자, 대학교수로서의 통섭적 관점에서, 이 두 문건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엄중한 함의를 짚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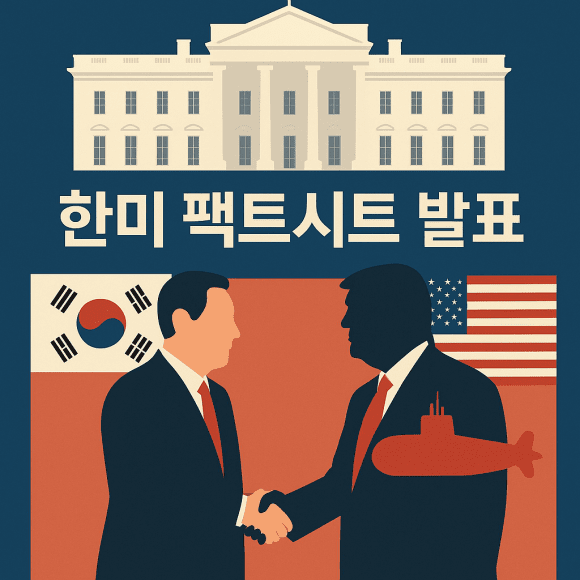
‘강병(強兵)’의 획득: ‘Asymmetric K-RMA’의 비대칭적 실현
이번 합의의 가장 빛나는 성과는 단연 ‘강병’의 획득이다. 팩트시트는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는 물론, 그 연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까지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미국이 지지함을 명시했다.
이는 필자가 주창해 온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Asymmetric K-RMA)’ 구상이 핵심적 수단을 마침내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SSN은 단순한 방어 자산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세적 억제(Offensive Deterrence)’ 수단이다. 이는 수세적 방어 태세를 벗어나 ‘현실주의 기반의 공세적 군사전략’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첫걸음이다.
물론 대가는 명확했다. GDP 대비 3.5% 수준으로의 국방비 증액과, 약 1,500억 달러 규모 승인 투자와 추가 협력까지 포함하는 막대한 대미 투자 패키지가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SCM 공동성명에서 과거 수년간 포함됐던 ‘북한 정권 종말’과 같은 격앙된 수사가 사라진 것은, 이제 동맹이 감정적 레토릭이 아니라 SSN이라는 ‘압도적 역량(Capability)’ 그 자체로 말하겠다는 냉철한 현실주의의 반증이다.
‘부국(富國)’의 위기: ‘한미일 SCEWS’ 구상의 역설
문제는 ‘강병’의 대가로 ‘부국’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팩트시트는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던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성과와 달리, 동맹국을 상대로 한 경제적 압박이 상시화·구조화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에 가깝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리 협상단은 미국의 최초 관세·투자 패키지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이번 협상이 상호 호혜적 타협이라기보다는, 안보 이익을 매개로 한 경제적 ‘청구’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강병’을 위한 안보 협력은 강화하면서도, ‘부국’의 기반인 경제 영역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는 분명한 모순이다.
이는 필자가 강조해온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와, 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SCEWS)’ 구축을 통한 경제안보 연대 구상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시작된 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SCEWS)을, 한국은 SCEWS라는 전략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려 해 왔다. 그러나 안보를 위해 뭉친 동맹국(미국)이 다른 동맹국(한국)의 핵심 산업을 관세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연대’가 작동할 수 있겠는가.
부국 없는 강병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경제주권이 흔들리는 ‘부국의 위기’를 방치한 채, ‘강병’만 앞세운 안보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안보협력의 동상이몽: 불안한 일본과 냉철해진 한국
이러한 한미 간의 ‘거래’를 바라보는 일본의 속내는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도 ‘새로운 황금기’를 선언하며 별도의 경제안보 프레임워크를 논의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SSN과 핵연료 주기라는 전략 자산을 손에 넣은 것은 군사·전략적 불안 요인일 수도 있다. 동시에 미국의 관세 압박이 형식만 바꿔 언제든 자신들을 향할 수 있다는 경제적 공포도 공유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이러한 ‘각개격파식’ 거래주의는 한·일 양국이 워싱턴의 변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자 관계를 실용적으로 강화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한미일 3각 공조가 워싱턴의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방식만으로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동맹의 지속 가능성은 이제, 미국이라는 허브와의 관계뿐 아니라 서울–도쿄 간 수평적 협력의 두께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미국은 국방비를 증액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한국을 ‘모범적 동맹’이라 치켜세운다. 그러나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군비 경쟁 심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 그리고 관세·투자를 통한 구조적 예속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동맹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감정적 친미’와 ‘감정적 반미’의 이분법이 아니라, 정책 패키지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져 묻는 전략적 시민성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결론: ‘글로벌 책임 강국’을 위한 고독한 ‘부국강병’의 길
결론은 명확하다. ‘피로 맺은 동맹’이라는 역사적・감상적 수사는 이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대신 동맹의 의미가 냉혹한 ‘거래’라는 새로운 의미가 덧입혀지고 있다.
우리는 이 거래를 통해 ‘공세적 군사전략’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SSN을 손에 넣었다. 이제 이 ‘강병’의 칼자루를 역으로 활용해,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 ‘부국’의 실리를 쟁취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략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필자가 제안해 온 ‘부국강병 기반의 글로벌 책임 강국’의 길은 오히려 더 험난해졌다. 과거에는 동맹의 지원 속에서 ‘부국강병’을 추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때로 동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부국강병’을 지켜내야 한다.
한미일 SCEWS 구상은 폐기할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거래주의를 견제하고 조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더욱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나아가 SSN과 SCEWS를 단순한 미국 요구 수용의 대가가 아니라, 한미일을 아우르는 ‘한국형 전략 플랫폼’으로 재설계할 수 있다면, 거래적 현실주의의 시대조차 대한민국에 새로운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주창하는 ‘부국강병 2.0’이자, ‘거래적 현실주의’ 시대를 통과해 나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고독하고도 존엄한 강대국의 길이다.
* 필자 소개 *
신치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서, 사단법인 미래학회 기획이사와 미래군사학회 사이버/네트워크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다.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 등 저술. 『국방환경과 군사혁신의 미래』 공저. 한미일 안보협력,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미래 전쟁과 대한민국의 미래 담론을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