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NDS 발표 전, 정책 아젠다를 선점한 C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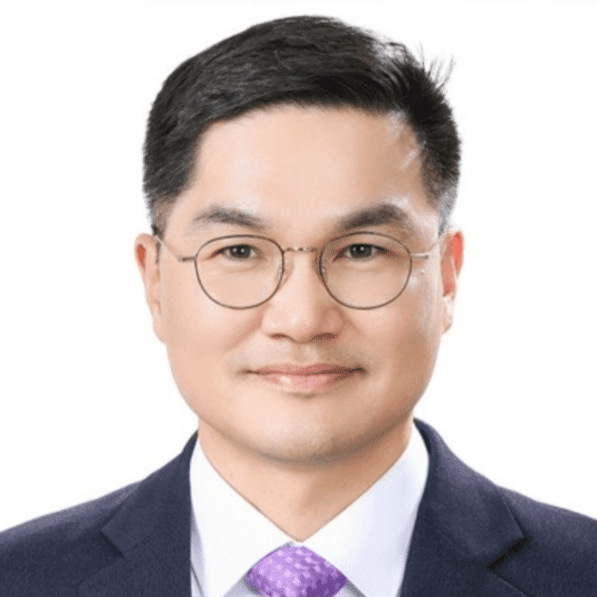
서론: 속도가 억제력이다
한미일 3국은 전통적 의미의 ‘동맹(alliance)’이 아니다. 기능적 안보협력 메커니즘(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이다. 따라서 이 협력의 효율성은 법적 구속력보다 속도(Speed)·규모(Scale)·회복력(Resilience), 즉 SSR에 달려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번 달(2025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 「Improving U.S. Coope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개선 방안)」에서도 SSR을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한미일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제도적 동맹’보다 실행의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든다. 첫째, 과잉분류(Over-classification)와 외국인 비열람 원칙(Not Releasable to Foreign Nationals, NOFORN)이라는 정보 폐쇄 문화. 둘째, 대외군사판매(FMS)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한 공급망 병목. 셋째, 상시 작동하지 못하는 다국적 전략기획 체계다. 이로 인해 동맹의 신뢰는 유지되지만, 협력의 속도는 지연된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하다. “속도가 곧 억제력(Speed is Deterrence)”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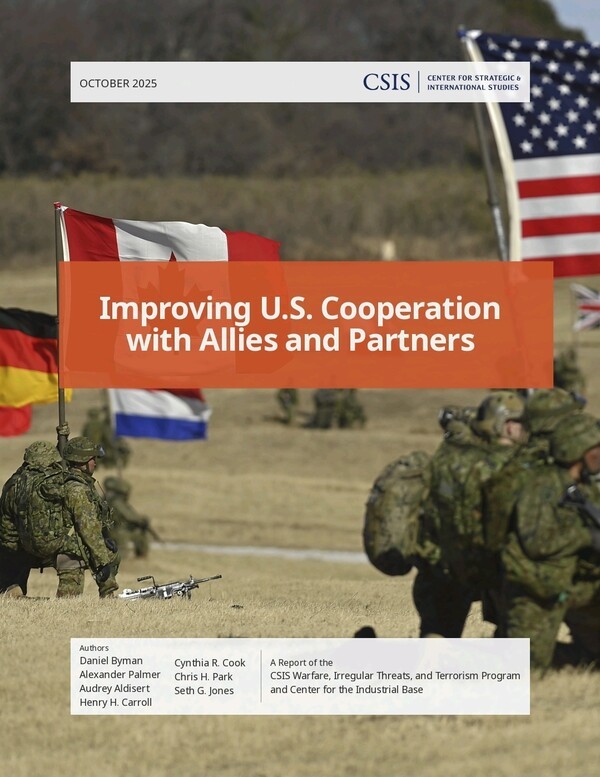
美 NDS 발표 전, 정책 아젠다를 선점한 CSIS
이 보고서의 상징성은 시점에 있다. 미국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나온 만큼, CSIS는 사실상 워싱턴 정책 커뮤니티의 선행 설계도 역할을 하고 있다.
미 NDS 초안이 대중(對中) 경쟁 구도와 본토 방위, 산업 기반 강화로 재편되는 가운데, CSIS는 ‘정보–기획–산업’이라는 세 축을 먼저 제시하며 차기 국가방위전략의 구조적 토대를 선점했다.
이런 점에서 CSIS 보고서는 단순한 권고문이 아니라 실행 메뉴얼(execution manual) 성격으로 봐야 한다. 특히 최근 일본의 새로운 총리 선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CSIS의 제안은 3국 간 협력을 제도보다 ‘문화와 루틴(routine)’ 중심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을 역설한다. 정치 일정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면 표준화된 협력 절차(SOP)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캘린더의 유동성은 합의된 SOP·체크리스트로 흡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선택: ‘행사와 구호’에서 ‘루틴과 지표’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틀 속에서 한국이 할 일은 분명하다. 이제 행사와 성명이 아니라 루틴과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첫째, 정보공유의 단계적 공개(Tiered Disclosure) 제도화를 주도하자. 정보를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 및 단계로 나누고, 저위험 정보부터 자동 공유토록 설계한다. 신뢰할 수 있는 한・미・일 3국 파트너에 대해서는 NOFORN 완화를 정례화해야 한다. 목적은 비밀의 축소가 아니라 지연의 단축이다.
둘째, 다국적 전략기획의 상시화・정례화다. ‘대만–남중국해–동중국해–한반도’를 축으로 한 쿼드런트 시나리오 랩(Quadrant Scenario Lab)을 정례화해 폴밀(Pol-mil) 기획을 동시 진행하는 루틴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국내 정치 변동이 있더라도, 절차적 루틴이 협력 속도를 보장해줄 것이다.
셋째, 산업·정비 협력의 패키지화가 필요하다. 지역정비체계(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RSF)와 인도·태평양 산업회복 파트너십(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PIPIR)을 활용해 공동정비(MRO)–공동재고–공동생산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계하자.
한국은 부산–사세보–요코타를 연결하는 ‘K-Surge Hub(공동정비·생산 연합 허브)’를 주도적으로 제안해, 유사시 복구시간(Mean Time To Recovery, MTTR)을 줄이는 실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
넷째, 경제·인지 강압에 대비한 집합적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 보험–대체시장–공동펀드로 구성된 3중 완충장치를 통해 기업과 부처가 정치적 리스크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 안보의 본질은 결국 시간(Time)과 복원력(Resilience)이다.
다섯째, 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Supply Chain Early Warning System, SCEWS) 구축을 주도하자. 한미일 SCEWS는 3국이 방산·핵심소재·해상물류 데이터를 선제 감시–경보–완화 루프로 묶어, 공급충격을 리드타임·TAT·MTTR 지표로 관리하는 체계다.
초기에는 민감도 A(비식별 집계) 데이터로 시작하고, 신뢰 파트너에는 NOFORN 완화를 명문화한다. 거버넌스는 RSF·PIPIR 데이터 허브와 양방향 연동하고, 경보가 울리면 미리 합의된 규칙에 따라 완화조치가 즉시 실행된다. 목표는 단순하다. 경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복구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국내 거버넌스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협력’
정부 내 ‘정보–기획–산업’ 3각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각 부문별로 정량 KPI(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 정보 부문: 승인 리드타임(Lead Time) 단축.
∙ 기획 부문: 분기별 시나리오 랩 개최와 후속 조치율.
∙ 산업 부문: 정비 처리소요(Turnaround Time, TAT), 예비품 가시성 지수.
참고로, 리드타임은 승인·조달, TAT는 정비·작업 회전, MTTR은 복구·정상화 시간을 뜻한다. 이런 수치는 협력을 구호가 아닌 데이터로 관리하게 만들 것이다. 여론 피로를 줄이면서도 협력의 신뢰도를 높이는 현실적 방안이다.
결론: 기회의 창을 잡아라
지금은 변화의 시간이 아니라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다. 한미일 협력의 본질은 속도를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국이 SSR(속도·규모·회복력) 원리를 정책·산업·군사 각 부문에 접목한다면, 행사와 성명 중심의 협력은 루틴과 지표 중심의 체계로 진화할 수 있다.
한국이 RSF·PIPIR 위에 K-Surge Hub를 구축하고, 정보–기획–산업의 세 축을 하나의 루프로 묶어낸다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한 단계 높은 속도와 신뢰로 재설계될 것이다.
속도를 공유하라. CSIS가 대한민국에 알려 주는 전략적 시사점이다. 속도를 공유하면 규모가 따라오고, 회복력이 축적된다. 그것이 바로 미 NDS가 완성되기 전, 대한민국이 먼저 제시할 수 있는 한미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실행형 안보협력의 설계도다.
【 주요 약어 설명 】
NOFORN 외국인 비열람 원칙 / FMS 대외군사판매 / ITAR 국제무기거래규정 / RSF 지역정비체계 / PIPIR 인도·태평양 산업회복 파트너십 / SCEWS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 필자 소개 *
신치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서, 사단법인 미래학회 기획이사와 미래군사학회 사이버/네트워크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다.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 등 저술. 『국방환경과 군사혁신의 미래』 공저. 한미일 안보협력,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미래 전쟁과 대한민국의 미래 담론을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